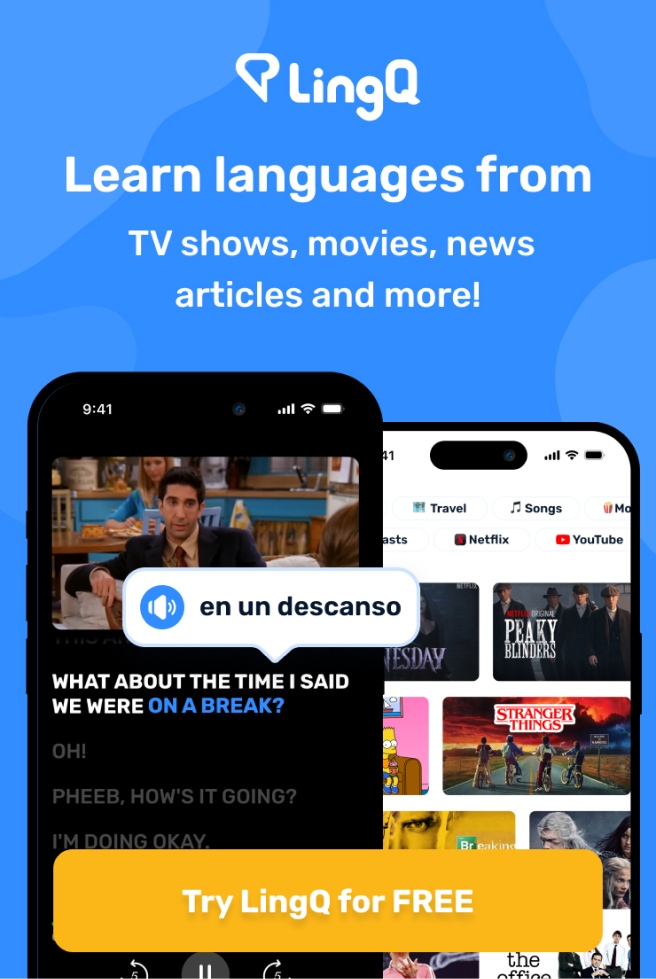남산 지하 조사실, 여덟 번째-139
[...]
남산 지하 조사실, 여덟 번째
나는 철없는 중국인 행세를 하려고 온갖 기지를 다 발휘해 봤지만 쉽지 않았다. 이곳에 와서부터는 수사관끼리 늘어놓는 담화 내용이 모두 조선말이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애써도 자연히 귀가 기울여져 신경이 쓰였다. 아예 못 알아들으면 모를까 모두 알아들으니 불쑥 그 담화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도 일어났다.
더구나 수사관들도 모두 조선 사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같은 것이 탈이었다. 그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면 나도 웃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었고, 그들이 화를 낼 일이면 나도 화가 나는 것을 어쩌랴. 수사관들이 입 다물고 긴장한 채 나를 감시한다면 이런 고통이 덜어질 것이었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잠시도 입을 다물고 있질 않는지 모르겠다. 계속 헛소리라도 지껄여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자유분방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다.
남산 지하 조사실에 도착하여 이틀은 매끼 죽이 나왔다. 입안의 상처와 오랫동안 굶다시피 한 내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인 것 같았다. 내가 식사할 때는 여자수사관 1명도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그녀는 죽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반찬으로 된장찌개가 나왔다. 외국인들은 찡그리며 싫다고 할 구수하고 쿰쿰한 냄새의 된장찌개가 내 눈앞에 놓이자 침이 꿀꺽 넘어갔다. 그렇지만 나는 그냥 내 몫의 죽만을 먹어야만 했다. 된장찌개를 앞에 놓고 죽을 먹자니 갑자기 입맛이 떨어져 숟가락을 놓고 말았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중국인 행세를 한다 해도 구수한 된장 냄새를 참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한 달 전 평양을 떠난 이후 조선 음식은 먹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된장을 듬뿍 떠서 물에 풀고 풋고추와 양파, 그리고 두부를 썰어 넣고 멸치도 같이 넣어 바글바글 끓이는 그 맛.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여자수사관에게 다음부터는 나도 밥을 먹겠다고 제의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잠은 들지 않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수사관들은 내가 잠든 줄 알고 속닥속닥 농담을 나누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말장난인 듯싶었다.
“누가 듣거나 말거나 재미도 없는 말을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인기 없는 희극인” “틀렸어. 학교 선생이야.”
그 말에 여자 수사관이 ‘피' 하고 코웃음을 쳤다. 수사관들의 잡담은 계속되었다.
“어느 판사가 도둑놈에게 왜 도둑질을 했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도둑놈은 배고프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고 항의조로 덤비더래요. 판사가 네가 훔친 건 구두가 아니냐고 따진 거예요. 그러자 도둑놈 왈 ‘ 맨발로 어떻게 도둑질을 다닙니까?' 하더래요. 맞는 말이죠, 뭐.” “대머리가 까진 남편에게 안해가 하는 말이 ‘남자들은 머리를 많이 써서 대머리가 되는 거라고 잡지에 났던데요' 하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그럼 여자는 말을 많이 하느라고 턱을 쓰기 때문에 수염이 안 나나?' 하고 쏘아부치더래.” “쏘련에서 시베리아 유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판사에게 말했대요. ‘미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면 왜 나를 그곳으로 유배 보내지 않느냐'고요.”
수사관들은 소리죽여 킥킥대고 웃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제발 그만들 둬!' 하고 소리 지를 것 같았다. 나 역시 그들의 롱담이 얼마나 우스운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다. 따라 웃었다가는 정체가 모두 드러나고 말기 때문에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곧 실수를 저지를 것만 같았다. 얼른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라도 가려고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서도 그 롱담을 생각하면 웃음이 터지려 했다. 나는 감시하러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온 여자수사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세수하는 시늉까지 했다.
나레이션 : 대남공작원 김현희의 고백, 랑독에 박수현이였습니다.